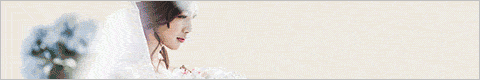<직업의 세계> 유리공장 -봉성유리
이정로
view : 4658
특집
[직업의 세계] 유리공장
유리를 만든다는 것…한 치가 아닌, 한 푼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
  |
| 한 장에 200㎏이 넘는 대형 유리를 전기 흡착기에 매달아 옮기고 있다. 대구·경북 최대규모의 유리공장인 봉성유리에서는 하루 50t 이상의 유리를 2차 가공하여 강화·복층유리를 생산해낸다. |
 |
| 17세에 먹고 살기 위해 유리소매점 종업원으로 유리업계 일을 시작했다는 봉성유리의 이수곤 사장. 그의 손엔 유리에 베인 47년간의 흉터가 세월의 훈장처럼 남아있다. |
#기억 2= 깨어진 유리는 버리는 법이 없다. 한지를 바른 할머니집의 미닫이 방문, 아랫목에 앉았을 때 시선 높이, 딱 그 위치에 조그마한 유리가 자리 잡곤했다. 방문을 열지 않고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창을 내어주던 유리. 그 유리를 통해 마당에 소복소복 쌓인 흰눈을 바라보던 겨울. 유리는 세상과 통하는 창이었다.
가게마다 쇼윈도가 들어서고, 집집마다 유리새시가 들어선 요즘. 자전거에 유리를 싣고 다니던 유리집 아저씨들은 다들 어디에 있을까?
◆반세기 유리 외길을 걸어온 대구경북 최대의 유리공장
“그때가 17세였으니까 올해로 벌써 47년째네요.” 이곳은 전국 500여개의 거래처를 둔 대구 토종 유리공장 <주>봉성유리(대구 북구 침산동)의 사무실. 자전거 뒷자리에 판유리를 싣고 다니던 유리소매점 종업원이었던 이수곤 사장(경력 47년)은 이제 1만1천㎡ 규모의 대구·경북 최대 유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장님, 손 좀 보여주세요.” 자꾸만 감추는 그의 두 손을 펼쳐보자 여기저기 유리에 베인 흉터가 지난 세월의 훈장처럼 새겨져 있다.
“아이고, 유리하는 사람들 다 이렇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나무 문틀에 유리를 잘라서 끼우는 단순 절단 작업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걸로는 안되거든요. 유리 원판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이니까.”
특수 모래 속에 있는 규사, 탄산석회 등의 원료를 녹여서 유리 원판을 생산하는 곳은 현재 한국유리, 금강유리 등 전국적으로 2~3곳뿐. 이곳 유리공장에서는 그 판유리를 가져다 2차 가공을 거쳐 특수 유리를 제작, 시공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정책에 따라 이 판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한다.
“기능성 유리와 PVC 창호가 더해지면 열효율이 30% 이상 높아지거든요. 한 마디로 난방비 10만원 들 것이 7만원만 들면 된다는 거죠. 창문만 잘 바꿔도.” 그러면서 그가 공장에 세워진 여러 종류의 유리에 가만히 손바닥을 가져다 댄다. 그러고 보니, 똑같은 유리인데도 저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 유리의 온도라…. 유리하면 그저 가로 세로 크기와 두께 정도로 품질과 가격이 달라진다 생각했던 유리 까막눈에게도 유리를 보는 새로운 눈이 트인 셈이다.
◆강화유리, 로이유리, 복층유리 등 천차만별 심오한 유리의 세계
“어어, 조심하세요. 조심!” 천장에 사람 키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대형 유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저 유리 한 장이 200㎏이 넘거든요.” 저 큰 유리를 어떻게 옮길까 생각했던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다. 전기 흡착기에 유리를 붙여 들어올리면 천장 가이드레일을 따라 힘들이지 않고 유리를 쉽게 옮길 수 있다. 이곳은 강화·복층 유리를 생산하는 경산 진량의 가공공장. 하루 40~50t의 유리가 이곳에서 2차 가공을 거쳐 나간다.
“쇠를 담금질 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뭐라고요?” “담금질, 담금질!”
강화유리 공정을 담당하는 정광재 기능공(경력 8년)과의 인터뷰는 대화라기보다는 고함에 가까웠다. 냉각수가 돌아가는 기계 소음 때문에 작업장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고 했다.
“이 판유리를 약 600℃의 고열로 가열한 다음 공기를 뿜어서 급랭시키면 표면에는 압축력, 내부에서는 인장력이 높아져서 강도가 보통 유리의 2~3배로 높아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다.
“이 유리는 특수장갑을 끼고 만져야 해요.” 얼마나 단단한가, 나도 모르게 유리에 손이 가자 전무 이영도씨(경력 18년)가 장갑 하나를 건넨다. 이건 일반 강화유리가 아니라 유리 표면에 은 이온 코팅처리가 되어 있단다.
“로이유리(Low-E glass)라고 하는데 유리 표면에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하면 열효율은 좋은 반면에 산화가 잘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 장갑을 끼나보다 했더니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 장갑을 낀다는 사람들.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특수 유리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창호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이곳 공장에서도 로이유리의 비중이 50%로 늘어났다.
“보통 유리의 열관류율이 2.7K라면 로이유리는 1.8K, 여기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면 1.6K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전문용어만 나오면 ‘위이잉~’ 마치 공장의 기계 소음이 더 심해지는 듯 느껴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수곤 사장의 말을 번역해보자면, 열관류율이라는 것은 열통과율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최근엔 열관류율이 1.9K 이하일 때만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유리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좋다, 여기까지는 겨우겨우 이해했다. 그런데, 아르곤가스는 또 뭘까?
“그게 복층유리를 만들 때…”.
‘위이잉~’ 또 기계소음이 커진다. 첩첩산중,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세계로 빠져드는 것만 같다. 어쨌거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층유리라는 것이 두 세장의 유리를 겹쳐서 만드는 것인데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두기 때문에 단열, 방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공기층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면 그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휴~ 오늘은 여기까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한 말은 고작 이게 전부였다.
“그러니까 집에 새시 공사를 할 때, 로이유리를 사용하고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복층유리를 써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유리공장, 강화유리처럼 삶도 강화된다
“일단 공장에 들어오면 손을 ‘앞으로 나란히’한 자세로 걸어다녀요. 앞에 유리가 있나 없나 눈이 아니라 손으로 확인하면서 다니는 거죠. 유리가 맑고 깨끗하고 순결해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주문 의뢰서를 들고 공장을 드나들 때마다 전도윤 사무직원(경력 5년)은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했다. 어디 그뿐일까?
“예전엔 건물 공사할 때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엔 한 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는 것이 3㎜인데 시공할 때 3㎜ 이상의 오차가 나면 그 유리는 폐기처분 해야 하는 거죠.”
유리 가공 기술력에 실측과 시공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유리업계의 현실! 하지만 유리공장 사장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일자리가 없다고 야단들인데, 사실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 못 버티고 나가거든요. 힘든 일을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다. “어떤 일이든 다 힘들죠. 저도 그랬고. 하지만 견디다보면 그 힘든 순간을 탁 넘어서는 시기가 와요. 그 순간만 넘어서고 나면,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강화유리처럼요.”
이곳은 유리공장. 쇠를 담금질 하듯, 유리를 강화하고, 그렇게 삶이 강화되는 곳이다.
글=이은임 방송작가 sophia9241@naver.com